아껴야 할 우리말
남기심(南基心) / 국립국어연구원장

수년 전 일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나한테 고향의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통지가 왔다. 모이는 장소는 고향 땅이 아니라 서울의 어느 다방이었지마는 하도 오랫동안 외국으로, 객지로 나도느라 고향에 못 가 본 지도 오래 되었거니와 초등학교 때의 친구들은 졸업 후에 거의 아무도 만나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통지를 받은 날 밤은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다.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언제였던가, 사십칠 년이나 되지 않았나? 일제 삼십육 년보다도 더 되었구나, ‘그때 그 여자 아이는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막상 동창회 당일의 감격은 옛날 어렸을 때의 친구들을 만난 반가움에서보다도 그들이 쓰는 말씨 때문이었다. 아, 어렸을 때의 이 고향 말씨. 내가 처음 시골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말씨. 우리 고향에서는 ‘뭐 어쩌고 어쨌니?’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을 ‘그래’ 하지 않고 ‘그랴’라고 한다. 서울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서울 아이들에게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모른다. 오래 잊고 있던 이런 고향의 옛날 말씨를 들으니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다.
모국어로서의 우리말, 더 정확하게는 어려서 배워 쓰던 고향 말씨에는 고향의 정서가 배어 있고, 어린 시절이 담겨 있고 우리의 혼이 들어 있다. 이러한 우리말을 버릴 수가 없고, 오염되는 것을 방치할 수가 없지 않은가? 국어는 크게 표준어와 지역 방언으로 나뉜다. 전 국민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동 의식을 위해서는 표준어를 써야 하지만, 지역 방언 역시 버릴 수가 없다. 지역 방언은 그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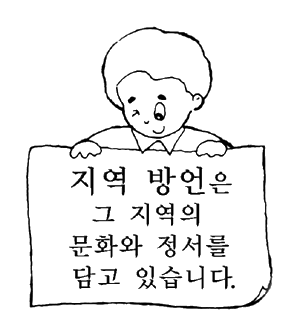
해방 후 지금까지 표준어 교육에 힘을 쏟느라 지역 방언 관리에는 소홀한 바가 없지 않았다. 표준어는 인위적으로 정해서 만든 것이지마는 각 지역의 방언은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다양한 모습의 우리말이다. 그런데 이 방언이 많이 훼손되고, 없어지고 한다. 고향 바깥에서 생활을 해 보지 못한 노년층이 사라지는 것과 비례하여 자꾸 없어진다. 그동안 없어진 것이야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이상은 더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하고, 이들을 수집해서 보존하는 일이 시급하다. 보존 방법도 문자화해서 하는 방법과, 녹음 상태로 보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어쨌거나 사라져 가는 방언 자료를 보존하는 일을 더 늦출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일은 하도 방대해서 몇 사람의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전 국민이 총동원돼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각해서 이 일에 호응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쓰지 않는, 자기 고향에서만 쓰는 말들을 국립국어연구원에 적어 보낸다면 일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연구원에서는 이 일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대한 사랑도 확인하고, 자기 고장에 대한 자존심도 아울러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